 세부에 오래 살고 보니 이별의 훈련입니다. 서서히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준비 안 된 이별을 맞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세부섬에 도착하여 살아가면서 제일 어색하고 조금 꺼려했던 필리핀 문화중 하나가 바로 장례문화 중에서 마지막 무덤입니다. 마지막 현지인들이 가는 곳은 한국인들의 사고처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부 시내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세부 시내 곳곳에도 잘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무덤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구 식민지 문화에서 왔지만 거기에 중국문화가 함께 접목이 되어 부자들은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집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무덤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훈련이 안된 우리 한인들에게는 그리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는 현지인들과 우리들이 이별을 맞이하는 또 다른 차이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부에 오래 살고 보니 이별의 훈련입니다. 서서히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준비 안 된 이별을 맞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세부섬에 도착하여 살아가면서 제일 어색하고 조금 꺼려했던 필리핀 문화중 하나가 바로 장례문화 중에서 마지막 무덤입니다. 마지막 현지인들이 가는 곳은 한국인들의 사고처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부 시내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세부 시내 곳곳에도 잘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무덤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구 식민지 문화에서 왔지만 거기에 중국문화가 함께 접목이 되어 부자들은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집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무덤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훈련이 안된 우리 한인들에게는 그리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는 현지인들과 우리들이 이별을 맞이하는 또 다른 차이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부에서의 첫 이별, 레스또
제가 세부섬에 살면서 제일 마음속에 아쉬움과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현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름은 레스또라고 하는데 이분은 저보다는 대략 10살 정도는 어렸지만 그동안 제가 만났던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했고 진실했고 늘 제 편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올랑고섬에서 였습니다. 그분은 올랑고 싸방이라는 마을에서 살았고 저는 싼비센텐라는 좀 먼 마을에 교회와 센터 그리고 유치원을 세워서 선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무척 가난했었고 또한 장애인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불편했기에 거동이 자유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섬에는 어머니와 레스또 두 분만 남아있고 남은 형제들은 다른 섬과 도시로 나와 살았습니다. 헌데 어머니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식구는 서로 서로를 의지하며 정글 같은 오지 섬에서 살아갔었는데 뜻밖에 선과 발이 되어준 아들이 갑자기 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죽게 되자 장례식 마지막 시신을 떠나 보내던 날 울부짖으며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수차례 외쳐대는 아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이별에 엄마가 준비가 되지를 않았기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으로 이 깜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저도 현지어도 자연스럽지 못했었고 또한 정글 같은 오지 낯선 섬에 살며 일하기가 쉽지가 않던 상황에 마음을 붙였던 레스또가 모든 부분 다 잘 도와주어서 너무 너무 고마웠었고 제가 그 섬에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음 모두 레스또였는데, 그런 사람이 하루 아침에 세상을 달리하게 되니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울부짖음처럼 '이제 나는 어떻게 이곳 세부에서 살아가지 레스또의 도움이 없어?'라는 혼자의 독백을 해보았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때부터 어렵지만 혼자 올랑고 섬에서 살아가기를 훈현하게 되어 오늘날 이제는 혼자서 이 세부 섬에 잘 적응하고 현지인들 세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자리르 잡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스또와의 이별이 오늘의 나로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제 25년을 이곳 세부 섬에 살고 보니 저도 모르게 현지인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현지 음식이 맛있어지고 또 제가 어색하고 두려워했던 도시무덤들도 이제는 친숙해져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느 ㄴ어느 곳에 묻혀야 하나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늘 생각해봅니다. 현재의 로빈슨 갤러리아로 가는 길 예전엔 화이트 골드를 가는 길에는 카레타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묘지에 쓰이는 묘비명을 만들어주는 가게가 즐비합니다. 젊었던 시절 이곳이 그리 유쾌하지가 않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내 묘비명은 어떻게 써놓을까를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세부가 좋은 건 춥지 않은 열대지방의 날씨도 있겠지만 누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 한국처럼 너무 무겁지 않고 가는 길이 결국은 우리 이웃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현지인들은 수많은 이별과 헤어짐을 체험해서인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듯합니다.
연인사이도 만나고 아이가 생겼다 헤어지더라도 한국 같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지를 않는 듯합니다. 우리문화는 즉흥적이어서 이별의 순간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감정의 표현과 슬픔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잊혀지는 반면 일본사람들을 보면 이별 앞에 슬픔을 극도로 자제하지만 그 아픔과 의미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추억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이곳 세부 섬의 이별도 그렇게 큰 슬픔만이 아닌 살아가는 과정이고 이별은 또 다른 성장이라고 느끼는 섬에서 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 안에 남아있는 이별에 대한 사자성어들입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거자필반(去者必返)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이곳 세부 섬의 이별은 또 다른 배움이고 성장으로 받아들이기에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물론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BC100~ BC44, 로마) "브루투스, 너마저도..."
마리 앙투아네트(1755~1793, 프랑스) "미안해요.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토마스 알바 에디슨(1847~1931, 미국) 부인 미나 "힘들지 않아요?', 에디슨 "아니오, 나는 단지 기다릴 뿐이오." 그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머리를 창가로 돌리며 속삭였다. "저곳은 참으로 멋진 곳인 것 같소."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6, 독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의 직업이거든"
레프 톨스토이(1828~1901, 러시아) "이것이 끝이로구나. 니체보"
마틴 루터(1483~1546, 독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늘 마음 속에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있다면 제 묘비명에 "한기역, 세부아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다 이곳에 죽다."라는 말은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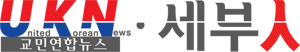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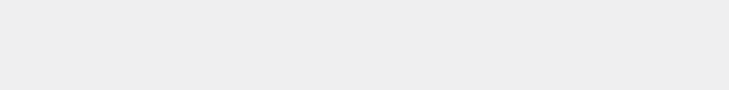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