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에 살고보니] 부자의 삶 [세부에 살고보니] 부자의 삶](/assets/file/dda55c6c48cca1144f9ecf7897126484.jpg)
세부에 살고 보니 부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처음으로 까모떼섬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도착하고 20년 된 에어컨 없고 문짝도 작동이 잘 안되는 봉고차를 타는 순간 제 머리속에는 26년 전 세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93년에는 지프니 이용비가 50센터보였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현지어로 “씽꼬엔따”였기 때문에 발음이 특이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디젤이 리터당 10페소정도였고 세부에 사는 원주민들 대부분은 ‘Nature Spring’ 이란 브랜드의 미네날 워터를 구경도 하기 쉽지 않았고 당연히 사먹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세부에 먹는 물이 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정수기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당시 간단한 영국제품을 샀었습니다. 또한 길거리엔 거리 음식점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시에는 대다수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바비큐집은 뿌엔테오스메냐에 있는 거리 바비큐집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사로 수많은 지방을 찾아다녔고 또한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던 올랑고섬에서는 100페소짜리 지페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페소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거스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섬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마닐라도 하루 중 낮시간에는 늘 정전이었고 대형건물이나 부자들 집에만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최신폰은 노키아 3210이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것도 세부섬에서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첨단 핸드폰이었습니다. 물론 흑백이고 통화와 문자만 보낼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화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엄청난 혁명의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에 3210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나온 3310의 모델은 세부에서 큰 사건으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치와 자존심은 많은 세부의 부자들은 신형 휴대폰을 손에 든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본다면 폰이라고도 할 수 없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단순기능의 구형 휴대전화기입니다.
아얄라도 없고 샹그릴라도 없었던 시기이고 신호등도, 가로등도 많지가 않아 밤거리가 무서웠던 때입니다. 막탄섬에는 당시 거의 한인은 살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스팔트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시골길로 차 지나가면 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리던 시골 비포장 도로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올랑고섬에 가보아도 원주민들 대다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미네랄 물을 마시고 TV 그리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부에서도 집에서 일하는 헬퍼 도우미도 물론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일부 외국인과 부자계층만의 영역이었던 문화생활은 이제 점점 원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고 있는 모두가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2019년 세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섬에서 부의 기준이 과거처럼 전기가 있는지, 핸드폰 있는지, 미네랄물을 마시는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주민이란 단어가 무색한 세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순수함을 소유했던 원주민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삶 속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세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한국 제품 중 ‘소주’를 좋아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의 술을 기호품으로 여기는 경제적 정신적 여유에서 ‘부자의 삶’을 사는 이들의 오늘날 삶 속에서 술인 ‘소주’를 꼽은 것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삶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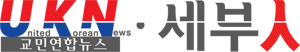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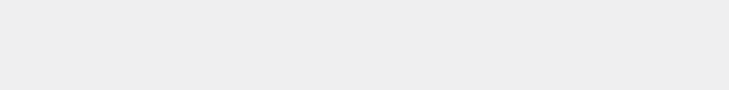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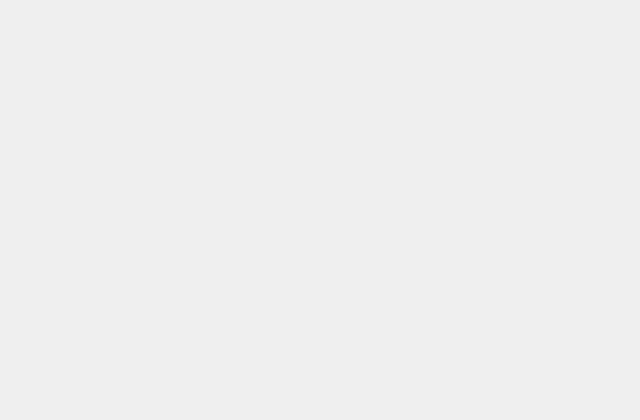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