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집에 살았다.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단칸방에서 유년을 보냈다. 반지하 단칸방으로는 하루에 해가 2시간쯤 들었다. 그나마도 벽에 긴 프레임을 그리며 사르가지고는 했다. 동생과 나는 형광등 불을 마음대로 켤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 베개를 딛고 형광등을 밝혔던 날에는,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날 안아주었다. 방에는 빨간색 테레비전 하나와 어머니가 시집올 때 혼수로 해왔다는 이불장 하나, 요강 하나, 지금은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접이식 둥근 양은 밥상 하나가 전부인 '없는' 살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슬픔이 무엇인지 몰랐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이 함께였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엄마와 아빠가 돌아았고 일찍 엄마가 돌아온 날이면 아빠가 네거리에서 파는 오방떡을 먹으러 밤마실을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한 번씩 찬 공기를 쐬는 것으로 하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조고 있다. 아니, 무궁무진한 추억이 그 단칸방 안에 있었다. 그때 나는 네 살이었다. 한국 나이로 네 살, 5월생이고 겨울이었으니 만 3살의 겨울이었다. 그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른쪽 콧구멍에서 붉은 피가 일자로 흘러내려 어머니가 급히 손수건으로 닦아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무도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마도 네가 누군가에게 들은 모양이지, 하지만 분명히 기억이 나고, 그날 이후로의 기억이 선명하다.
아마도 내가 수집할 수 있던 정보가 극히 제한되었던 탓에 또한 반복적이었던 탓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이 나이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네 살, 단칸방은 추웠다. 집주인 아줌마를 외할머니가 군자댁이라고 불렀던 것과 엄마가 당시에 서울 화양리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다녔던 567버스에 군자동이 적혀있었던 것들로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네 살 겨울을 보낸 곳이 군자동인 것을 미루어 알았다. 그리고 그 단칸방에서 나는 나이 마흔에 이르도록 쓰려고 하는 어떤 이미지들의 기초가 된 상상들을 했다. 낡은 벽지는 분홍색 꽃무늬로 중간에 아메바 패턴이 섞여 있던 것이었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베개에는 거북이와 어린병정, 양과 마차와 꽃이 번걸아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나는 누워서 거북이의 수를 수없이 반복하여 헤아리고는 하였다. 어머니의 기억으로는 내가 구구단을 못한다 했으나, 셈만큼은 1천까지 거뜬히 세었다.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딱따구리가 방영 중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외워 동생에게 들려주고는 하였다. 마치 변사처럼 온몸을 이용해 몸짓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면, 좁은 방안은 딱따구리가 등장하는 만화 세상이 됐다. 아직 어렸던 동생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요강이 아닌 곳에 오줌을 누거나 바지에 또이라도 싸면 나는 어째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놀아주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나의 동생은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푹 빠지곤 했다. 내 생애 첫 번째 독자였던 샘이다. 그 방에 대해, 나는 사춘기와 대학생이 되던 무렵까지는 어둡고 무덤 같은 곳으로 묘사해 글을 쓰고는 했다. 사실, 그만큼 지독하지 않았다. 돌이켜 보니, 아무 것도 없었던 그 '없는' 집은 내 생애 가장 풍성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공간에 대해 사춘기에도 글을 썼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썼고 그리고 마흔이 되어서도 쓴다.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 내가 상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야 글이 되어 나오려 하고 있다.
'없는' 집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없는' 집을 떠올렸다. 사춘기와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나는 정신없이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듯이 벌고 사들이기를 반복하였다. 그것은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처럼 계속 되었다. 분명 결승점이 저 앞에 있는 듯 한데, 가보면 새로운 결승점들이 보였고 그 결승점으로 보였던 지점들을 통과하며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고 집에는 냉장고 여러 대와 고가의 책상과 가구들이 넓은 집을 발디딜 틈없이 좁게 만들어갔다. 그러고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 안달하고 그 집을 채우지 못해 안달하며, 더 많이 벌기 위해 잠을 줄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내일로 미루며 오늘을 살았다.
그 모든 것이 멈춘 것이 바로 '세부'에서였다. 물론 세부에 처음 와서는 서울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더 넓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가구를 원했으며 한국에서와 같은 식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번역일을 맡아 한달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채로 먹고 자며, 세부까지 와서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내일로 내일로 미루며 오늘을 살았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든 것은 막탄에서 세부로 집을 한번 옮긴 뒤였다. 한국에서 짐을 붙이지 않아 본래 가진 게 없었던 나는 탈람반 깊숙이 있었던 새 집에서, 처음 '텅빈' 경험을 했다. 그곳은 반지하도 아니고 단칸방도 아니었지만, '없는' 집이었다.
나는 그 '없는' 집에서 여행자로 살았다.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진 것을 더 늘리지 않게 되었다. 3권의 책을 1개월 안에 무리하게 번역해 넘기는 일을 간신히 마치고 첫째 아들이 "나는 왜 여기 있나요?"하고 스스로 묻는 것을 본 뒤의 일이다. 빈 집과 현재 내 위치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날은 하늘에 별이 유난히도 많아서 우리는 모두 탈람반 집의 마당에 나가 자리를 펴고 누워, 모기에 뜯기며 별구경을 했다.
아무 것도 업는 집, 깔끔하니 흰 벽만 있던 집. 그곳에서 우리는 드디어 '추억'을 쌓기 시작했다. 단칸방과 같지는 않았지만 단칸방에 살던 그 시절처럼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또한 상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면 나란히 누워 책을 읽고 뒹굴거렸고 오래 오래 모두가 잠이 들 때까지 서로에게 질문을 했다. 아침은 저절로 눈이 떠지는 날들이었다. 힘이 차고 기운이 났다. 아이들은 다투어 식탁으로 달려갔고 나는 아침 시간 정성을 들여 요리를 했다. 접시에 담아가는 요리에는 '활기'가 있었다. '없던' 집에서는 소리가 가득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 그리고 사는 소리. '없는' 집에서는 냄새가 가득했다. 요리하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 꺾어온 들꽃들의 향기 그리고 사는 냄새. '없던' 집에서는 볼게 가득했다. 아이들은 종일 그림을 그리고 뒹굴거렸다. 어느 동작 하나도 놓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없는'집에 가기 전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맡지 못하고 보내 버린 것일까?
정신이 들었다. 바로 '없는' 집에서였다. 그 뒤로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세부에서 4년째를 맞는 나는 나의 집을 보며 생각한다. 지금도 나는 '없는' 집이다. 그런데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하다. 새해를 열며 나는 잠시 '없는' 삶의 풍요로움을 생각한다. 빈 접시 위에 얌전하게 놓은 소세지 하나. 이제 '족'할 줄 알게 된 것일까?
- 달리(Dah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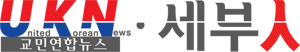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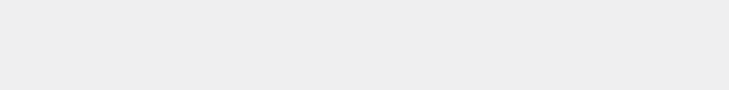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