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며칠 뒤 선생님께서 따로 불러 성적표와 함께 '봉투'하나를 건네 주셨다. 장학금이었다. 보통은 부모님께 전달이 되어야 하지만, 맞벌이를 하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학교에 찾아올 수 없다고 연락하시자 내 편에 건네주신 모양이었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고 나는 그 장학금으로 다니고 싶었던 미술학원을 등록할 수 있겠나 싶어 마냥 기뻤다. 장학금으로 미술학원을 등록하게 된 나는, 다시 미술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장학금은 '누군가에게'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쉬 오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도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역 어린이집에 스스로 찾아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기도 했다. 몇 만원씩 후원을 하거나 재단에 기부하는 일도 하고 가지고 있던 책을 고아원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을 꾸리면서부터는 내 아이들을 챙기기도 바빴다. 쉽게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바로 즉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루었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3년 동안 나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그 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 아니신가. 돌이켜 보면 당시 우리 집의 형편으로는 중학교 과정도 제대로 마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미술 교육을 몇 개월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것이다. 만약 그때 나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의 이웃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미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경험,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겨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더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나는 결국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출판사에서 이뤄지는 기부 행사에 적극 나서고는 했다. 콩세알도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다. 세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어디 마음 붙일 곳이 필요하면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방법을 해결해 가라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콩세알에서 놀며 책을 읽으며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는 '콩세알'이기를 바라고 시작했던 것이다. 남편과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가정을 꾸리고 세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여유라고는 늘 없었지만, '콩세알' 만큼은 잘 지켜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쓴 책의 저작권료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콩세알을 운영하는데 썼다. 많은 분들이 애써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지만 콩세알은 늘 부족했다. 아무리 치워도 지저분했고 아무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어도 인력이 모자랐다. 날마다 그림을 그리며 노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던 종이가 부족할 때도 있고 화장지가 부족할 때도 있고 간식을 마련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하루종일 상근하며 봉사해주시는 분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직원을 뽑았지만 직원 인건비를 제 때 맞춰 주는 일도 힘이 들었다. 로봇 청소기를 하나 장만해라. 아떼를 고용해라. 필리핀 선생님을 더 많이 써라. 기부금을 받아라. 회비를 올려라. 수업료를 받아라. 강사료를 깎아라.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셨다. 하지만 워낙 책이랑 공간만 확보하고 시작한 일이다 보니, 좋은 의견이 있어도 수렴하기가 어려웠다.
성미산 마을의 리더 겪인 한 선생님께 들으니, 동네에서는 백수가 한 명 있어야 한다고 한다. 돈은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 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미국의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관장은 '부자'여야 한다고 한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주려면 먼저 '부자'여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늘 마음이 부자이면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콩세알을 직접 운영하여 보니, 없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더 돕고 싶은데, 더 잘해 주고 싶은데, 방법은 알지만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무엇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 심정을 지난 10개월 동안 느끼면서, 나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자리를 빌려, 조심스럽게 한인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나는 한인회 옆자리에서 신문을 만들며 그분들이 하던 일을 지켜보았다.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도 많았지만 어쨌든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가며 그 조직을 지금껏 유지해 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던 복지가는, 넉넉한 경제 형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외에도 몇 학생이 더 그 장학금을 받은 줄로 안다. 그분이 3년간 나에게 퍼부어 주신 것은 어떤 '기운'이 되어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마음이 된 것일 터이다.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 아이들 학비까지 털어 '콩세알'을 지켜보려고 애썼지만, 더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콩세알 같은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부 현지 아이들에게까지. 아이들이 모여 소통하고 어울리며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 같은 곳을 마음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되시는 분들이 꼭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해 본다.
그 마음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의 마음밭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리라 믿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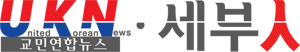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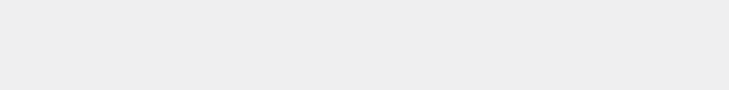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