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 출판사의 '눈높이' 브랜드에서 한 때 텔레비전 광고를 한 적이 있다. 선생님이 아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아직 아이가 없던 처녀 편집자 시절 때에는 이 광고가 그렇게도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신형건 선생님의 '거인들이 사는 나라'를 읽을 때에도 어른들 틈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라고 좋아라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렇게 감동하며 어른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지 해 놓고 아이 놓고 엄마 되니 딴 생각이 든다.
첫째 아이가 한 돌이 되어 따박따박 걸을 때, 말도 못하는 애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딱딱 찾아낼 때마다 나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공간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한 천재가 아닐까 했다. 한 돌이 조금 지났을 때, 외할머니가 사준 어린이용 전기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더니 냉큼 내려서 자동차 밑을 들어보던 것을 보고 이 아이는 커서 '기계 공학자'가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을 고백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첫째는 자동차에 흥미가 있고 훗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부풀었던 기대는 어린이집을 가면서 날마다 깨졌다. 16개월이면 비교적 일찍 기저귀를 때고 배변을 가렸음에도 11월생인 아들은 생일이 빠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늦은 아이였고 24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하기 시작한 아들은 또래 여자애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말이 느린 아이였다. 아이가 하나뿐일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변명할 거리조차 없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책을 찾아봤지만 책에도 그렇게 나온다. 24개월 정도면 이문어기로 두 단어 정도로 의사를 표현할 줄 안다고. 당시에 나는 영유아 교재를 개발하고 있을 때였고 마침 돌쟁이 한글 시리즈 개발의 기획을 의뢰받았었다. 일을 핑계로 수없이 많은 책을 찾아보고 읽었지만 24개월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24개월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하는 아이에 대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너무도 쉽게 "애가 아직 말을 못해?" 하거나 "책 만드는 사람 애가 어떻게 말이 늦어?" 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아이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의 뇌발달이 늦은 것은, 내가 태교에 집중하지 않았고 일을 하느라 아이를 외할머니 손에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에게는 둘째와 셋째가 있었고 둘째와 셋째를 보면서 아이마다 언어발달의 형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몬테소리, 페스탈로치 같은 위인전 집필을 의뢰받으면서 "Late Bloomer"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늦게 꽃이 피는 것이다. 즉 아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받은 자극에 대해 스스로 정리가 되어 확신이 들기까지는 내놓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언어 발달에서부터 확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보통 한 단어로 말하는 시기(일문어기)와 두 단어로 말하는 시기(이문어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문장으로 말하는 시기(삼문어기)로 말문을 바로 트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다섯 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인슈타인 때문에 애가 탔다. 에디슨도 학습 부진으로 진단을 받아 어머니가 무척 애를 태웠다. 보통 아이들의 발달과 에디슨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레이트 블루머들의 경우 이러한 시기에 지지와 이해를 받으면 기질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달 경향을 보인다. 나는 나의 초조가 얼마나 무지한데서 왔는지를 그제야 알았다. 첫째 아이라 모든 것이 놀랍고 경이로운데, 어떤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둘째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부터이다. 수년간 아이들의 뇌발달을 공부하고 아이들 발달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둘째는 그 아이의 기질을 최대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학습도 아이가 원치 않으면 안 시켰다. 즉 한글도 영어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나이 8살이 된 것이다. 초등학생이 되는 시기에 한국에서 2개월 동안 특훈을 하고 아이는 간신히 한글과 영어를 읽고 한자리 연산은 하는 상태로 학교에 보냈지만, 같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늦는 아이였다.
기대로 학교에 보냈던 첫째가 기대만큼 공부를 해 준 것과 달리, 기대하지 않았던 둘째는 오히려 날마다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읽기 능력이 신자하고 셈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물론이요, 놀라운 이해력을 보였다.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스스로 공부할 거리를 찾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어쩌면 내가 그동안 아이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마주 앉아 아이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쩌면 나는 아이의 머리꼭지만 내려다보면서 아이의 표정도 마음도 읽지 못하고 왜 쑥 자라지 않는지만 답답해하지는 않았던 것일까. 만약 내가 좀더 일찍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에 마주 볼줄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나 또한 주변의 말들에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 지켜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인들에게 고한다. 소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라고. 당장 8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의 입장이 되어 학원에서 8시간씩 튜터를 받아보라고. 답답하고 좁은 닭장 같은 교실에서 노는 아이가 공부를 잘 할지, 밖에서 마음껏 놀고 난 아이가 공부를 잘 할지. 한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면 그건 튜터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닐 수 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잘못된 기대치가 문제일 수도 있다. 스스로 물어보자. 내가 내 아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나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이 내 눈높이로 봐주길 바라기 전에 그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낮춰 봐야할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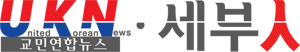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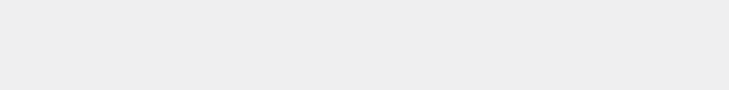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