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쳤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정민 선생의 책, <미쳐야 미친다>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빠져 있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건' 아름답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미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을 차린다고 했을 때, 지인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두고 '세부에 미친 X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들어도 아프지 않았다. 물론 연타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스스로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랬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고하고 나는 미친 듯 사는 게 좋다. 특히나 집에서 미치는 일은 '더욱'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한 편의 뮤지컬을 보여준다. 물론 지독하게 피곤한 아침은 생략되기도 한다. '일어나!'를 외치는 대신에 세 아이가 깨서 보거나 말거나 혼자 춤추고 노래하며 아침이 좋은 이유들을, 깨어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다.
저 소리 들리니, 창밖에 새들은 벌써 일어나 정답네.
저 소리 들리니, 창밖에 구름은 벌써 일어나 흐르네.
저 소리 들리니, 창밖에 해님은 벌써 일어나 하늘 위.
어딨니? 어딨니? 아침은 어딨니? 어딨니? 어딨니? 아침은 어딨니?
날 불렀니, 나 여기 있어! 네 발등에 왔어!
날 불렀니, 나 여기 있어! 네 가슴에 왔어!
날 불렀니, 나 여기 있어! 네 입술에 왔어! 아침이 왔어.
이렇게 막 지어서 부르고 뽀뽀를 퍼붓는다. 아이들은 엄마가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 투정 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잔소리가 필요 없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한 표정이 되어 씻고 내려오라고 말한다.
그런 뒤 무대는 부엌으로 옮겨간다. 부엌의 소리들이 음악처럼 어우러진다. 밥통은 김을 뿜으며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음을 알린다. 가스레인지 위 기름을 듬뿍 두른 프라이팬에서는 계란 물을 입은 생선 라푸라푸가 지글지글 익어간다. 도마 위에서는 양파와 오이가 바쁘게 채쳐지고 양푼 안에서 버무려진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또 보기 좋게 미친다. 부엌과 창고, 식탁을 오가는 발걸음은 발레리나처럼 가볍다. 참고로 나의 몸무게는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에 달하지만 내가 요렇게 춤추듯 살살 걸어 다니는 것을 아이들은, 낯설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익숙한 나머지, 나의 육중한 몸이 공간을 누비는 것을 사랑스럽게 봐준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또 뮤지컬 주인공처럼 자작곡을 불러댄다.
푹푹, 흰쌀밥에 오늘은 콩.
지글지글, 계란 옷 입은 라푸라푸.
참기름 둘러 살살 무친 상추 샐러드.
버물버물, 오이채 나물.
뽀글뽀글, 된장찌개.
짭조름 조린 계란.
아침 드시러 오세요. 오침 드시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렇게 아침을 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렇게 미쳐서 보내는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도 노래를 불러준다. 그래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 잔소리를 칠 일이 없다.
내가 집에서처럼 자주 미치는 곳은 바로 교실이다. 도서관에서 한국사 수업을 할 때, 나는 되도록 아이들에게 연극이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연출 장면을 보여주고는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니가 김유신이라면 어떤 선택 할 건지?"라거나 "그 입 다물라. 선생님 몹시 진노하신다." 같은 말을 섞어 질문을 하고 혼을 내도 깔깔거리며 재밌다 한다. 재미가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내 수업을 듣고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단다. 그 아이가 다시 내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 몰라도 그랬다면 나는 성공!
삶을 뮤지컬처럼 재미나게, 뮤지컬 배우처럼 무대 위에서 만인을 위해 미쳐 살고 싶다.
혹시 동참하실 분?
세부에서 나는 내가 집필한 유아동아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의 뮤지컬 대본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일의 끝은 어느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나의 미쳐서 사는 삶은 계속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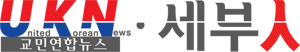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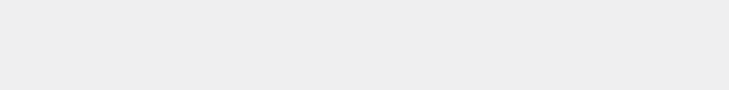





댓글